내 인생의 첫 서평을 써보고자 한다. 사실 서평을 써본적이 없어 독후감과 서평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이해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서평의 정의가 book review, 즉 책을 리뷰하는 것이므로 내 관점에서 이 책을 평가하는 것이 되겠다. 아마 글을 쓰고 나면 독후감과 다를 바 없는 서평이겠지만, 첫 서평부터 잘 쓸 리 만무하니 이 책의 서평을 시작으로 앞으로 꾸준히 서평을 쓰는 습관을 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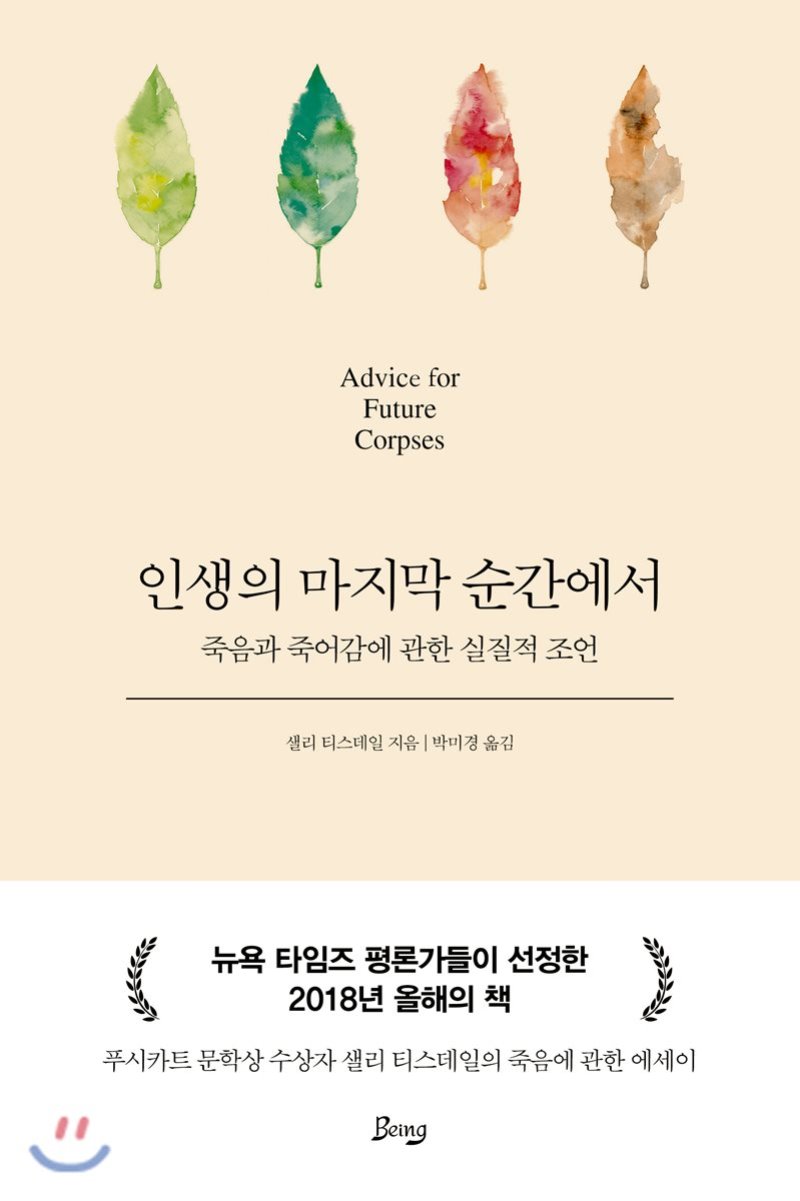
내가 이번에 읽은 책의 제목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원제: Advice for future corpses)]이다.
샐리 티스테일 지음 | 박미경 옮김 | 로크미디어 출판사
이 책은 사람의 임종 직전 몇달부터 임종이 된 순간, 그리고 임종 후의 상황을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사건 주변의 상황과 모습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배치해줌으로써 책을 읽으면서 좀 더 몰입할 수 있었다.
<임종 전>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의 임종을 마주하곤 한다. 그 사람들 옆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임종 전에 해당하는 챕터에서는 우리가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될 사람에게 어떠한 행동과 태도를 보여야 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그런 측면에서 책의 초반부에서는 사색을 많이 하게 되고 철학을 다루는 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책에서 준 교훈은 매우 다양하고 사실 그 교훈들을 다 체화하거나 외웠을 정도로 책을 다독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곧 죽을 사람의 모든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은 그 사람이 하루라도 오래 살길 원해서 치료를 하지만, 그런 과정마저도 본인에게는 원치 않는 행동일 수도 있다. 또한 임종 직전의 사람은 정신이 온전치 않거나 말하기 어려운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젊은 나이인 지금에서라도 내 죽음이 어떻게 이뤄지길 원하는지를 설명해주는 죽음 계획서를 써야 한다. 죽음 계획서에는 내가 임종 직전에 어떠한 형태의 치료나 도움을 받고 싶은지 분명하게 작성하는 것이고, 어떠한 치료나 생명연장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빠르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 또한 명시해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죽음 계획서는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나 의료인들의 혼란을 막아준다.
<임종이 된 순간, 시체>
또한 이 책은 임종이 된 순간, 즉 시체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를 [시체]라는 챕터에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 사실 나는 이 책에서 가장 임상깊은 챕터가 바로 이 부분이었다. 앞선 챕터들은 사색을 하게 만든 반면, 이 챕터는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 장례를 치루는 방법등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해주고 있다. 혹자는 단순히 설명문처럼 내용을 줄줄이 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자가 생생하게 하나하나의 방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부분을 보면서 몸이 많이 아팠다. 왜냐하면 내가 그 시신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영화를 보고 나면 매우 피곤한데, 주인공에 몰입하여 그 주인공이 했던 일들을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체력을 소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에서는 화장을 하거나 화학 처리를 하거나 하는 등에서 뼈와 살이 어떻게 되는지를 정말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시신이 된 것마냥 몰입이 되었고, 그러한 이유로 내 몸이 아팠던 것이다.
<임종 후>
임종 후 죽은 자의 가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배웠다. 누군가는 쓰러질 듯 울기도 하고, 누군가는 덤덤하기도 하다. 그들에게 너무 과하게 슬퍼하지 말라거나 왜 이렇게 덜 슬퍼하냐는 식의 말은 옳지 않다. 그리고 어떤 말이 됬든 그들에게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되게 그들을 더 복잡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무엇이든 들어주겠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인 것 같다. 언젠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들만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 이 책에서 배웠던 이런 애도의 교훈을 꼭 실천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평>
우선 죽음과 관련된 책을 처음 읽어보았기 때문에, 이 분야의 다른 책과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은 굉장히 아쉽다. 이 책을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죽음과 관련된 실질적인 교훈을 많이 전달해줬다는 것이다. 내가 죽게 되거나, 나의 소중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그들의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될 것이다. 각 상황에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할 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책의 초중반부에 해당하는 임종 전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챕터는 엄청 천천히 읽으면서 사색을 하면서 읽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좋았던 것은 앞서 말했듯 [시체] 챕터에서 각각의 장례 방식, 시체 처리 방식을 너무 잘 묘사해서 몰입이 잘 되었다는 것이다. 뛰어난 영화를 보면 내가 자연스럽게 몰입이 되고 주인공이 된 것과 같이 되어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피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도 [시체] 챕터를 읽을 즈음에는 나의 살과 뼈가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것 같아 피곤하고 몸이 아팠다. 그만큼 몰입이 잘 되게끔 글이 쓰여졌다는 뜻이다.
아쉬운 부분은 사실 나에 대한 부분인데, 내가 아직 죽음과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지 않았으므로 수준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없다는 점이다.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 많았겠지만 아는 것이 없으니, 우선 내가 아는 경험과 지식 측면에서는 위의 두 가지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임종 전에 해당하는 챕터를 읽을 때는 철학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다가 [시체] 챕터쯤부터는 설명과 묘사가 뛰어난 책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임종 전에 해당하는 챕터를 읽을 때는 조금 읽기 어렵다는 느낌도 살짝 받았다. 혹자는 정반대의 생각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나는 기본적으로 공학을 업으로 삼는 사람이기에 특정 대상의 묘사나 설명을 하는 글을 훨씬 많이 읽고 그런 글이 더 쉽게 읽힌다. 그러나 누군가는 사색을 하고 질문을 던지고 마음 속 깊은 생각을 변화하는 문구들을 읽는데 더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글의 느낌이 중간 챕터 부근에서 바뀐 느낌을 받았는데, 이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가독성을 방해하거나 책의 몰입을 방해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반적으로 책은 읽기 수월했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태도, 행동을 해야 하는지 실질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었으므로 책 자체는 완성도가 높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아쉬운 것은, 내가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 이 책을 어떻게 추천할 수 있을까? 에 대한 질문이다.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에게 아직 먼 단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나의 부모님들조차 큰 문제가 없으시다면 적어도 20년 정도는 더 사실 것이므로 그들에게조차 아직 먼 단어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을 추천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일 수록 죽음에 대한 태도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논리적인 합당한 근거가 있을까?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것은 솔직히 말하자면 지금 회사를 입사하기 전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 주제와 상관없이 교훈이 있고, 읽을만한 재미난 책, 적어도 읽었을 때 손해가 나지 않는 양서를 읽고 싶었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 죽음이라는 것을 학습해야 할 필요성이나, 진심으로 이 주제를 알고 싶다고 생각해서 읽은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직까지도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이유가 이 책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직까지도 나는 평범한 일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은 아니면서 그렇다고 죽음에 관해서 깊게 관심을 갖지도 않는 사람들, 에게는 이 책을 어떻게 추천해주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서다. 내가 이 책을 좀 더 읽고, 좀 더 좋은 교훈을 학습하고, 위의 평범한 사람들도 읽으면 좋은 책이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오면 그 때 이 책을 다른 이들에게 추천하도록 하겠다.
'독서 - 서평, 책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평,독후감 #6] 노인과 바다 (0) | 2020.07.13 |
|---|---|
| [서평#5]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0) | 2020.07.13 |
| [서평#4] 2019 부의 대절벽 (0) | 2020.07.13 |
| [서평#3]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법 (0) | 2020.07.13 |
| [서평#2] 초격차 : 넘볼 수 없는 차이를 만드는 격 (0) | 2020.07.13 |